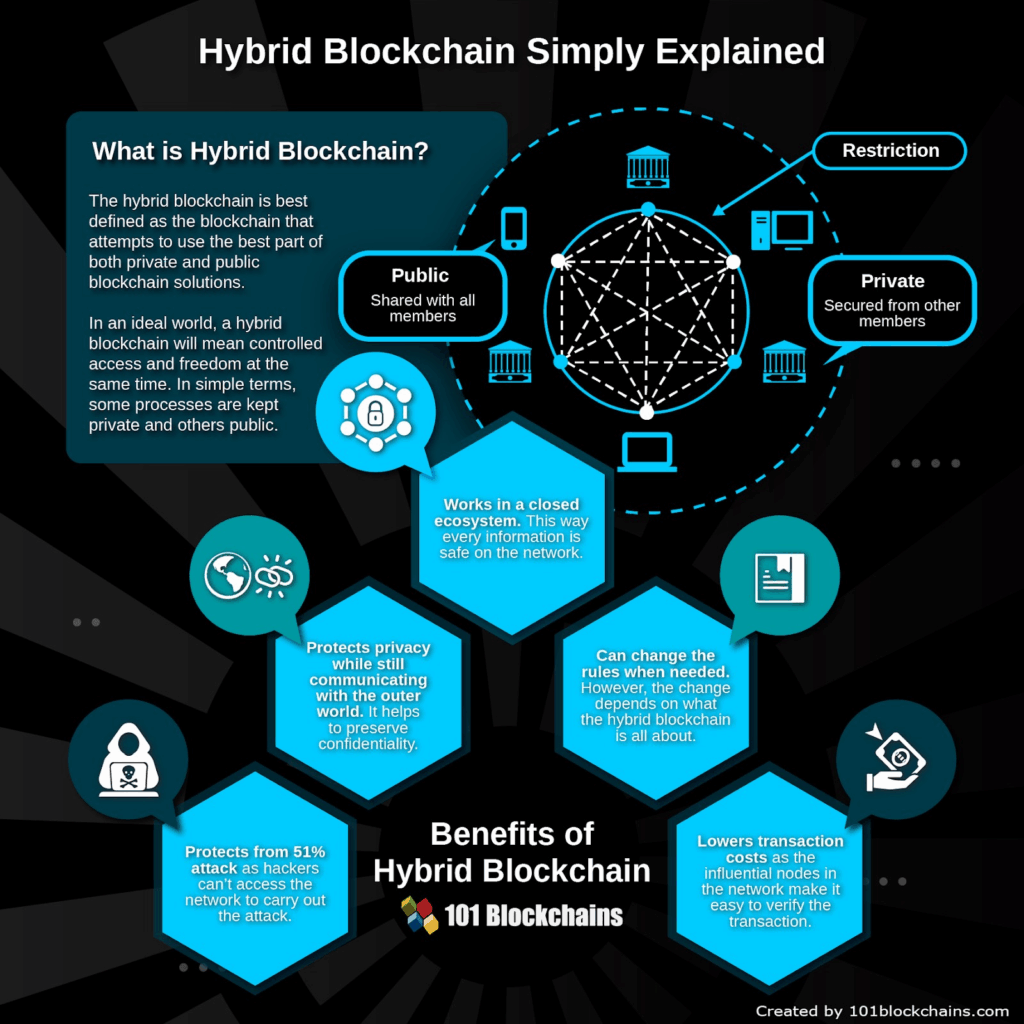
CBDC 실험 중단과 스테이블코인 집중 현황
2025년 6월 말, 한국은행은 ‘한강 프로젝트’라 불린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2차 실험을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1차 테스트에 참여한 은행들의 비용 부담 및 상용화 로드맵의 불확실성, 그리고 민간 중심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논의가 활성화된 영향이 컸다. 실제로 1차 테스트에는 7개 은행이 참여해 약 350억원을 투입했으나, 정책 요건 추가(STR·FDS)와 사업성 우려로 후속 실험이 연기되었다. 이처럼 CBDC와 민간 스테이블코인 병존 여부가 불확실해지자 은행권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준비에 집중하고 있으며, 컨소시엄 모델과 비은행 협업 논의가 빠르게 진행 중이다.
은행 주도 vs 비은행 참여: 모델별 비교
은행 중심 모델은 안정성과 규제 대응 면에서 강점을 지닌다. 현재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iM뱅크·수협·케이뱅크 등 9개 은행이 오픈블록체인·DID협회(OBDIA)에 참여하며, 부산·경남은행과 토스뱅크도 합류를 검토 중이다. 반면 비은행·핀테크 모델은 확장성과 혁신성을 앞세워 네이버파이낸셜(페이 월렛),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사업자와 해시드·블록체인 업체들이 합종연횡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들 모델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모델 | 참여 주체 | 장점 | 단점 |
|---|---|---|---|
| 은행 주도 | 주요 9개 시중은행 | 엄격한 규제 준수, 금융안정성 확보 | 유연성·확장성 제한, 대형 인프라 구축 비용 발생 |
| 비은행 협업 | 핀테크·간편결제사·블록체인 투자사(해시드 등) | 빠른 시장 진입, 사용자 경험 혁신 | 규제 불확실성, 신뢰성 검증 필요 |
| 절충형 모델 | 은행+핀테크 합작법인 | 안정성+혁신성 조화, 리스크 분산 | 이해관계 복잡, 운영 주체 간 이견 조율 필요 |
위 표는 각 모델의 특성을 한눈에 보여주며, 한국형 스테이블코인 설계 시 고려해야 할 핵심 요소를 정리한 것이다.
스테이블코인 시장 규모 및 글로벌 동향
글로벌 주요 10개 스테이블코인의 시장 총액은 2025년 5월 말 기준 약 2,309억 달러(한화 약 287조원)에 달한다. 미국과 EU는 각각 미국달러·유로 기반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최근 디지털자산기본법안 발의로 국내도 민간 발행 허용 요건(자기자본 5억원 이상 등)을 규정 중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은행뿐 아니라 비은행도 발행권을 가질 수 있어, 국내 시장은 빠른 성장 국면에 진입할 전망이다. 글로벌 동향을 보면, 페이팔(PayPal), 코인베이스(Coinbase)가 자체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하는 등 플랫폼 사업자의 직접 진출이 눈에 띈다. 이에 따라 국내 참여사들도 외환 결제·무역 정산·증권 클리어링 등 다양한 유즈케이스로 확장할 준비를 하고 있다.
한국형 스테이블코인 규제 및 법제화 전망
국회 발의된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은 은행 우선 발행 후 비은행 확대를 골자로, 발행 준비금 요건과 감독 체계를 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거시건전성·통화정책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협업해 규제를 정립할 계획이다. 주요 쟁점은 준비금 보유 방법(현금·채권 등), 외화 스테이블코인 대비 환리스크 관리, 시뇨리지(발행차익)의 배분 및 회계 투명성 확보 방안 등이다. 특히 시뇨리지 수익은 발행주체의 수익 모델이자 통화정책 효과와 직결되므로, 법제화 과정에서 명확한 배분 구조 정립이 필수이다. 이러한 규제 설계는 안정성과 혁신을 조화시키는 ‘한국형 혼합 모델’을 현실화하는 핵심 열쇠가 될 것이다.
기술 인프라와 보안 요구사항
스테이블코인은 실시간 결제·정산 시스템과 연계되므로,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처리 속도(TPS), 스마트 컨트랙트 보안, 사용자 지갑 관리체계가 중요한 기술 요소다. 국내에서는 이더리움 레이어2, 하이퍼레저 패브릭(Hyperledger Fabric) 기반 솔루션을 검토 중이며, KISA·금감원 주도로 보안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AML/CFT(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방지) 시스템과 연계해 의심거래보고(STR) 및 이상거래감지(FDS) 체계를 갖춰야 해외 규제 이슈에도 대응할 수 있다. 기술 인프라 구축 시에는 확장성, 가용성, 복원력(Resilience)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하며, 리스크 관리 수준은 국제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